AI 시대에도 살아남은 수공업 직업군: 금속공예 수업을 20년째 운영하는 기술자
기계보다 사람의 손이 먼저인 교실
서울 종로구의 한 예술 공방 골목, 유리문 너머로 불꽃이 튄다. 작은 송풍기와 버너, 금속판, 망치 소리가 이어지는 이곳은 장정수 기술자가 20년째 금속공예 수업을 운영하는 작업장이자 교실이다. 대학교나 문화센터가 아닌, 실제 공방 내부에서 배우는 수업은 드물다. 그는 “기술은 책에서 배울 수 없어요. 손으로 배워야죠”라고 말한다.
장정수 씨는 올해 61세. 1980년대 후반부터 금속공예를 시작해 90년대엔 브랜드 장신구 납품을 하던 실무자였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학생을 받기 시작해 지금은 연간 200명 가까운 수강생이 이 공방을 거쳐 간다. 대부분 비전공자며, 순수하게 '금속을 다뤄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다. 그는 기계가 대신하지 못할 손기술의 본질을 가르친다. “레이저 끊기, 3D 모형화도 좋지만, 손으로 톱질하고 망치로 펴보면 그게 훨씬 느껴져요. 이건 감각의 일이에요.”
수업은 기계 설계가 아니라 손 연습부터 시작한다. 망치 잡는 법, 줄질하는 손의 각도, 불의 온도를 느끼는 시간. 그는 모든 동작을 손으로 시범 보인다. AI는 도면을 정확히 그려내고 CNC 기계가 자동으로 가공하지만, 그는 ‘사람 손에 맞는 물건’은 사람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다. “기계는 정답을 만들고, 사람은 사용자를 위해 수정하죠. 금속공예는 그래서 손이 먼저여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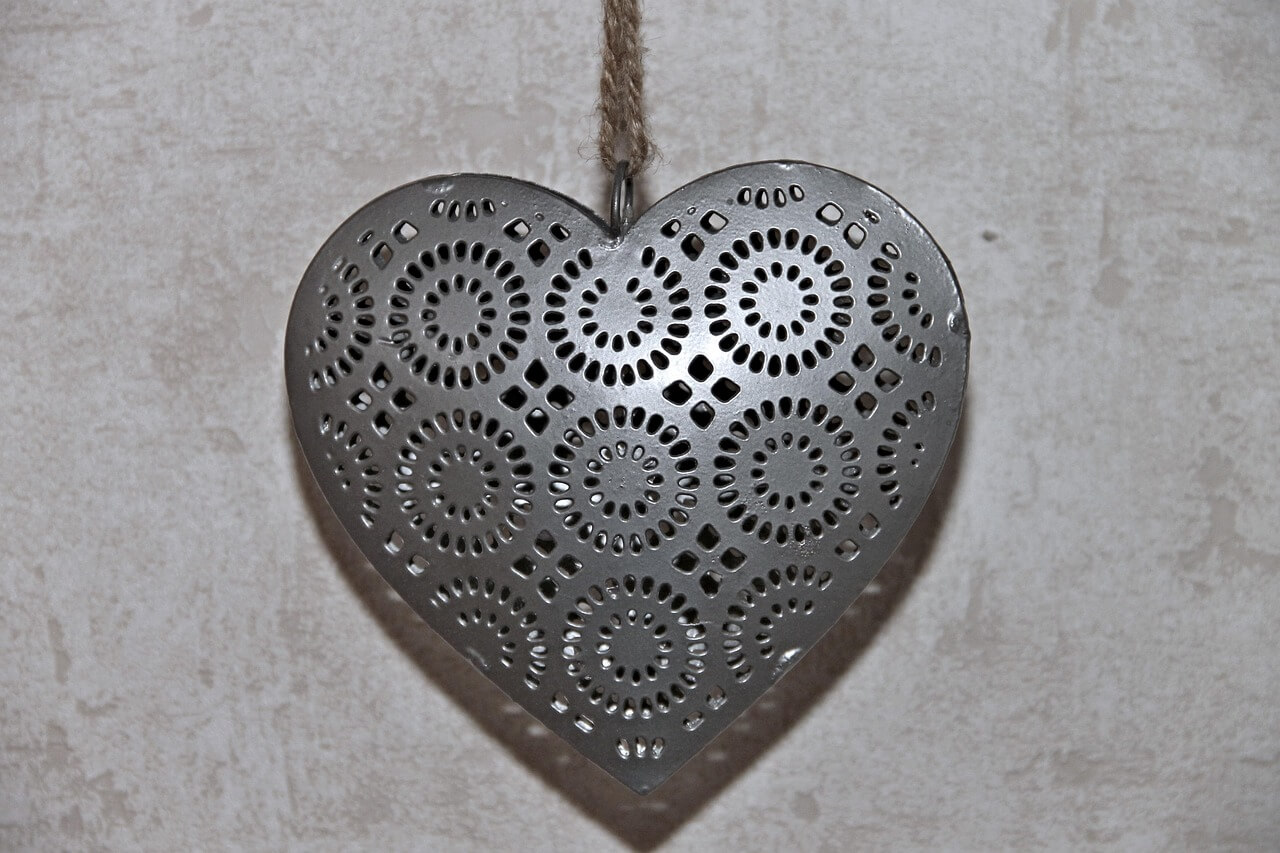
불과 망치, 그리고 사람의 리듬으로 완성되는 공예
장정수 기술자의 수업은 매우 아날로그 하다. 컴퓨터는 없고, 칠판 대신 종이에 그린 도면, 수업 교재는 그의 손때 묻은 도구들이다. 가장 먼저 가르치는 기술은 '톱질'이다. “톱질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보여요. 조급한 사람은 선을 넘고, 소심한 사람은 힘을 못 줘요.” 그래서 그는 손의 리듬을 가장 먼저 조율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불 조절은 금속공예에서 가장 핵심이다. 금속은 섭씨 700도부터 연해지고, 1,100도 이상이면 녹아내린다. 기계는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하지만, 그는 ‘색’을 본다. “불이 노랗게 올라오다가 희미해질 때가 제일 좋아요. 그걸 보려면 수백 번은 봐야 해요.” 수강생들에게는 온도계를 쥐여주지 않는다. 대신 철판에 불을 대보며, 감각으로 그 순간을 익히게 한다.
작업대 위엔 매일 다른 금속이 올라온다. 은, 동, 황동, 때로는 철과 주석도 쓴다. 그는 금속마다 ‘성격이 있다’고 말한다. “동은 무르고 쉽게 상하지만 반짝여요. 황동은 단단해서 다루기 어렵지만 소리가 좋아요.” 이런 설명은 교과서에 없다. 경험이 말해주는 언어다. AI는 물성을 데이터로 정리하지만, 그는 감각과 성격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그의 수업은 ‘금속을 이해하는 수업’이 아니라 ‘금속과 친해지는 수업’이라 불린다.
기술을 넘어서 삶으로 이어지는 공예 교육
20년 동안 수업을 하면서 그는 다양한 수강생을 만났다. 디자이너, 회계사, 교사, 취준생, 주부, 60대 은퇴자까지. 어떤 이들은 취미로 시작해 브랜드를 창업했고, 누군가는 단 하나의 반지를 만들기 위해 6개월을 배웠다. 그는 그 과정에서 ‘금속공예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감각’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손으로 뭔가를 만들면, 사람 마음이 변해요. 생각이 느려지고, 시선이 달라져요.”
어떤 수강생은 가족을 위해 식탁용 브론즈 나이프를 만들었다. 그는 모서리 하나하나를 손으로 갈았고, 칼자루를 나무로 덧댔다. 장정수 씨는 그 결과물에 감탄하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당신의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에요.” 그런 피드백은 어떤 점수보다 더 강한 동기를 만든다. 기계는 만들 수 있지만, 그런 의미는 부여할 수 없다.
최근 그는 디자인 학부의 요청으로 외부 특강도 진행했지만, 대부분 수강생은 여전히 공방 수업을 원한다. 이유는 명확하다. “사람 손이 옆에서 같이 움직일 때, 배움이 생기거든요. 온라인은 편하지만, 손맛은 안 느껴져요.” 그는 손에 잡히는 공예야말로 AI 시대에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비정형, 불완전, 감정이 담긴 흔적들. 그것이 사람의 작업이 가지는 무게다.
그는 수업 중 한 수강생에게 이렇게 말한다. “기계는 실수를 고치지만, 사람은 실수에서 배우죠. 실수한 자국을 남기세요. 그래야 당신만의 작품이 돼요.” 이 말에 감동한 수강생은 실수한 반지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완성했다. 금속공예 수업은 그렇게 기술을 넘어서 감정을 전하는 배움의 과정이 된다.
AI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있는 손의 기술
장정수 기술자는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사람들이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본능, 또 하나는 손으로 만든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감정이다. “기계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건 누군가의 마음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손으로 만든 건 마음이 따라가요.”
그는 현재도 새로운 기술보다는 기본에 집중한다. 반지를 만들 때 단면을 깎는 연습, 불에 데우는 감각, 망치질의 각도를 체크하는 반복. 수십 년을 했지만 여전히 신중하다. “손은 기억도 하지만,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매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해요.” 그가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의 도구를 닦고, 손을 데우는 일이다.
AI는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디자인과 제조를 연결하고, 예측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럴수록 ‘느리고, 유일하며, 손으로 만든 것’의 가치가 더 커질 거라고 말한다. “빠르고 정확한 건 이미 넘쳐나요. 그 사이에서 느리고 따뜻한 게 더 빛나게 돼요.”
그래서 그는 금속공예 수업을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다. 몇 명이 오든, 몇 명이 떠나든, 이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한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 “이건 내 직업이자,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AI가 못하는 건 결국 ‘함께 손으로 느끼는 감각’이에요.” 그 감각이 존재하는 한, 금속공예는 살아 있는 기술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