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종이, 손으로 짜내는 전통의 숨결
첨단 기술이 종이 없는 디지털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다. 종이 문서 대신 태블릿이 책을 대체하고, 수작업 기록은 클라우드에 저장된다. 인쇄용 종이는 수천 톤씩 공장에서 빠르게 쏟아지고, 디자인까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손으로 종이를 꼬아 공예품을 짜는 사람’이 있다.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공방에서 40년 넘게 전통 장지를 다루며 지승공예를 이어가고 있는 67세 박인숙 장인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승공예(紙繩工藝)는 한지(韓紙)를 꼬아 끈을 만든 후, 그 끈으로 다양한 생활용품과 장식품을 엮어내는 한국의 전통 공예 기술이다. 박 장인은 종이 한 장을 직접 뜨는 일부터 시작한다. "공장에서 나온 종이는 기계가 찍어낸 거예요. 숨이 없어요. 나는 직접 닥나무 껍질을 삶고, 두드리고, 체로 걸러 장지를 만들죠. 그렇게 만든 종이만이 꼬였을 때 끈질기고 부드러워요." 그녀는 한 장의 종이를 손끝으로 나눠 0.5cm 정도 폭의 띠로 자르고, 물을 발라 손으로 비틀어 가느다란 끈을 만든다. 이 끈은 완전히 말린 후, 다시 손으로 엮여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끈은 단단하고 유연하다. 기계로는 이 질감을 구현할 수 없다. 박 장인은 말한다. “AI가 종이접기 도안도 만들고, 자동으로 끊기도 하지만, 이건 손가락으로만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종이의 결, 수분, 날씨에 따라 힘 조절을 매번 달리해야 하니까요.” 같은 장지라도 겨울엔 수분이 적고, 여름엔 끈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작업 감각을 계절마다 다르게 조율해야 한다. 그녀에게 지승공예는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자연과 손의 대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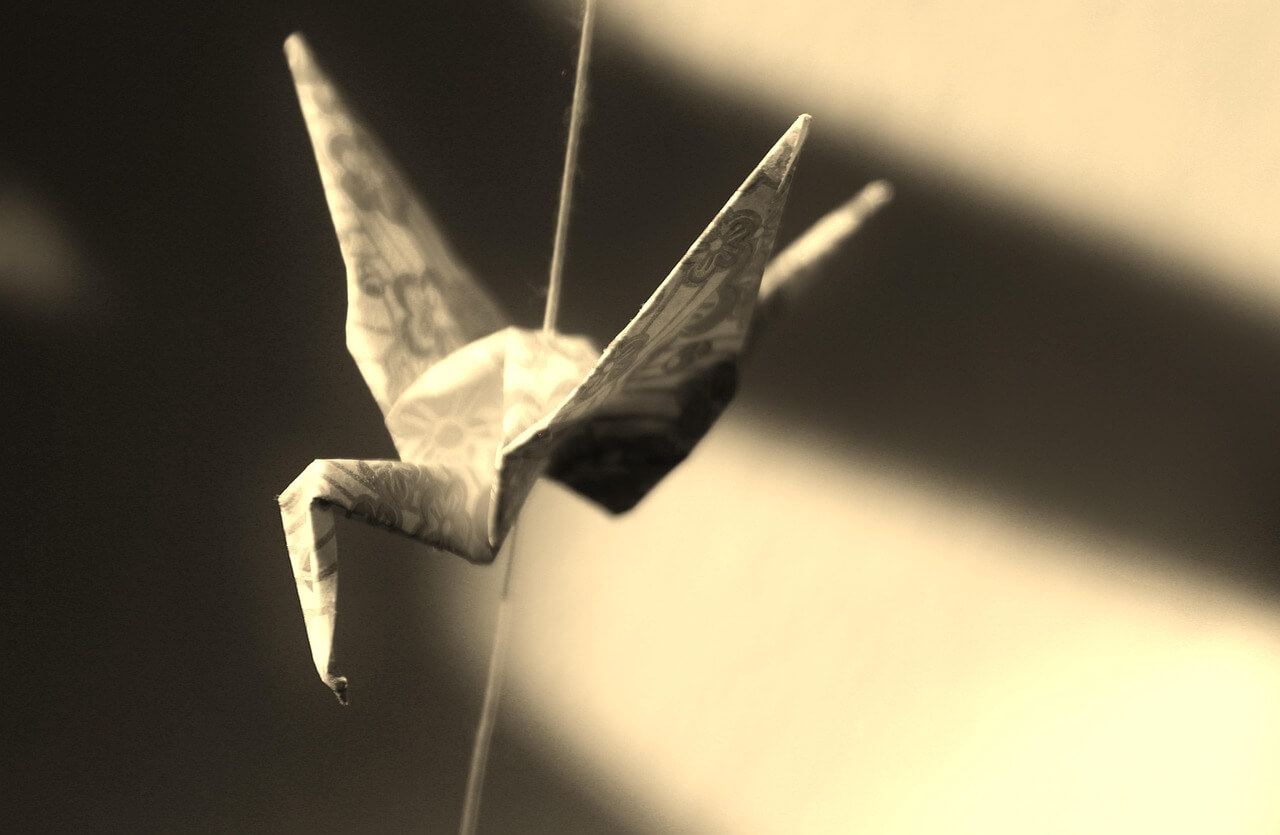
손끝으로만 느낄 수 있는 종이의 생명과 기술의 감각
지승공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종이의 질과 감촉이다. 박인숙 장인은 종이의 상태를 손끝으로 확인한다. 촉촉한 종이는 꼴 때 잘 붙지만, 너무 축축하면 곰팡이가 생기고, 마르면 끊어진다. 그래서 그녀는 하루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지 않는다. “아침에 종이를 만져보면 그날 할 수 있는 작업이 감으로 와요. 이건 손이 기억하는 기술이에요.”
그녀는 종이를 비틀어 끈을 만들고, 다시 그 끈을 손바닥으로 눌러 펴거나 말아 모양을 만든다. 바구니, 매듭, 그릇, 다기 세트, 액자 등 다양한 형태로 엮을 수 있지만, 각각의 작업은 오로지 손으로만 가능하다. 한 작품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3일, 길게는 한 달 이상이다. 특히 박 장인은 ‘생활 속 공예’를 지향한다. “전시용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바구니, 함, 종이 등을 만들어요. 쓰다가 종이 냄새가 나면 그게 진짜 공예죠.”
기계는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면 정확한 비율과 모양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지승공예는 그 반대다. 작업자 손의 감각, 종이의 결, 끈의 탄력, 엮는 속도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AI는 종이를 ‘소재’로 보겠지만, 나는 종이를 ‘시간’으로 봐요. 이 종이를 만들기까지 3개월이 걸렸고, 꼬아서 끈 만들기까지 또 며칠이 걸렸어요. 그게 손에 남아 있어야 이게 살아 있죠.”
작품을 완성한 뒤에는 옻칠이나 천연염색을 더해 마감한다. 손으로 꼬인 종이 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단단해지고, 색도 깊어진다. 이것이 수공예가 가지는 진짜 가치다. 박 장인은 말한다. “공장에서 바로 만든 건 처음이 제일 예뻐요. 하지만 손으로 만든 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뻐져요. 그게 사람 손이 만든 거라는 증거예요.”
전통이 아닌 생존의 기술, 지승공예가 이어지는 이유
지승공예는 흔히 ‘전통 공예’라는 말로 불린다. 하지만 박인숙 장인은 이 기술이 단지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말한다. “나는 이걸 살아가기 위해 했어요. 처음엔 생계를 위해 바구니를 짜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나를 먹여 살렸죠.” 그녀는 20대 중반부터 시골 마을 장터에서 대나무 바구니 대신 종이 바구니를 팔기 시작했다. 처음엔 무시당하였지만, 점점 사람들이 그 실용성과 가벼움을 알아보고 주문이 늘었다.
지금도 그녀는 한 달에 수십 개의 제품을 만들어 전국 공예 시장과 온라인 플랫폼에 납품한다. 제품은 쓰레기통, 연필꽂이, 소반, 주머니 함 등 실용성을 갖춘 형태가 대부분이다. “지승공예가 예뻐서가 아니라, 써보면 편해서 다시 사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기계로 만든 것보다 오래가고, 따뜻하거든요.” 특히 그녀는 고객과의 교류를 중요시한다. 직접 사용하는 사람의 이야기와 필요를 듣고, 그것에 맞게 형태를 조금씩 바꿔 제품을 완성한다.
AI는 수요를 예측하고, 패턴을 분석하고, 소비자의 니즈를 빠르게 잡아낸다. 하지만 박 장인은 오히려 천천히 듣고, 손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택한다. “사람의 삶은 다 달라요. 기계는 그걸 평균으로 계산하지만, 나는 그 사람만을 위한 크기와 모양을 짜요.” 어떤 고객은 “현관에 둘 작은 바구니가 필요하다”고 했고, 박 장인은 그 고객의 집 구조를 듣고 정확히 맞는 크기와 형태로 바구니를 짜주었다. 기계는 만들지 못할 세심함이 손에서 나온 것이다.
시간이 만든 공예, 사람의 손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들
지승공예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종이를 만들고, 끈을 꼬고, 형태를 만들고, 마감까지 수십 단계를 거친다. 박인숙 장인은 이 시간을 ‘비효율이 아닌 의미’라고 말한다. “빨리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게 목적이면 이걸 못 해요. 이건 천천히 만들수록 깊어지고, 그게 바로 가치가 돼요.” 실제로 그녀의 작품 중에는 제작에 3개월 이상 걸린 작품도 있다. 그만큼 손이 많이 가지만, 그 손의 흔적은 제품에 그대로 남는다.
최근 몇 년 사이, 박 장인의 제품은 해외 전통 공예 박람회와 온라인 편집숍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일본, 프랑스, 대만에서는 수공예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실제로 장인의 작품을 구매해 가는 고객도 많다. “외국 분들은 오히려 이 수공예가 왜 중요한지, 왜 오래 걸리는지 잘 이해하세요. 그분들은 빨리 만든 걸 오히려 불신해요. 손으로 천천히 만든 건 오래 쓰니까요.”
그녀는 현재 지승공예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 소규모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그 수가 많지는 않다. “처음엔 멋있어 보여서 오지만, 종이 꼬는 일만 하루 종일 반복해야 하니까 다들 힘들어해요. 근데 이 기술은 그 과정에서 얻는 게 더 많아요. 단순히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만드는 마음을 배우는 거죠.”
AI 시대에도 살아남은 수공업 직업군은 결국 ‘사람을 위한 기술’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박 장인의 손끝에서 태어난 지승공예는 단순히 장식품이나 민속품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쓰이는 생활의 도구이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감각이며, 사람의 손으로만 만들 수 있는 감정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그녀의 공예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닿고 있다. “기계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이건 흉내가 아니라 손으로 지켜낸 진짜예요.”
'AI 시대에도 살아남은 수공업 직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AI 시대에도 살아남은 수공업 직업군: 망치로 두드리는 동 종 만드는 사람 (0) | 2025.07.04 |
|---|---|
| AI 시대에도 살아남은 수공업 직업군: 오직 손으로만 만든 수제 연필 (1) | 2025.07.04 |
| AI 시대에도 살아남은 수공업 직업군: 수제 가죽 공예 1인 브랜드의 생존기 (0) | 2025.07.03 |
| AI 시대에도 살아남은 수공업 직업군: 대나무 바구니 장인의 손끝 이야기 (1) | 2025.07.03 |
| AI 시대에도 살아남은 수공업 직업군: 수공 도자기 장인 인터뷰 (1) | 2025.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