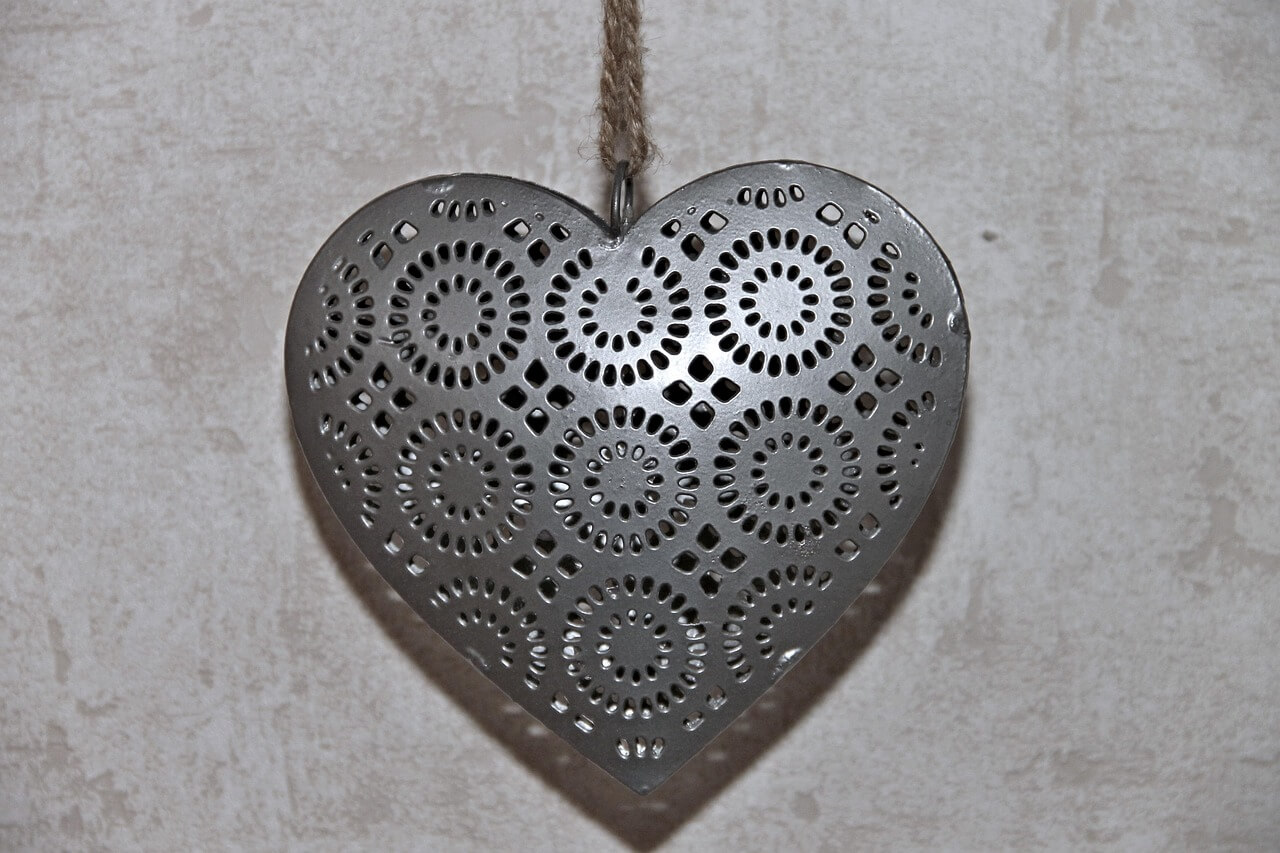기계가 찍어내지 못하는 한 잔의 온기산속에서 불어온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드는 소리만큼 정직한 소리는 없다. 전남 담양, 그 대나무의 고장에서 40년 넘게 대나무 찻잔을 만들어온 장인이 있다. 올해 69세가 된 박진문 장인은 지금도 매일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 대나무를 손질하며 하루를 연다. 그가 만든 찻잔은 전통 다도 모임이나 차 애호가들 사이에서 ‘살아 있는 찻잔’으로 불린다.박 장인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의 작업에는 전기톱도, 자동 연마기도 없다. 손도끼, 칼, 송곳, 줄 하나면 충분하다. “대나무는 살아 있는 재료예요. 톱날이 아니라 손끝으로 그 결을 느껴야 해요. 칼날이 조금만 삐끗해도 찻잔이 갈라지거나, 물이 새요.” 그는 대나무의 나이, 마디의 위치, 수분 함량까지 오로지 손과 눈으로..